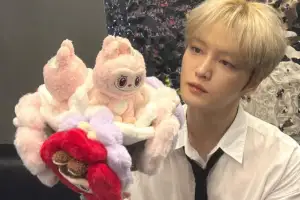김태균 경제부장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대선을 목전에 두고 100개가 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중심의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15개 권역으로 나눠 106개의 지역 공약을 만들었다. 기존 추진 사업 71개에 신규사업 96개를 추가했다. 야당 후보와 박빙의 경쟁을 벌이던 상황에서 표심에 호소하는 선심성 지역발전 공약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정치적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지난 5일 정부가 바로 이 106개 지역 공약에 대한 기본 처리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5월 내놓은 140개 국정과제 추진 계획에 이은 두 번째 ‘공약 가계부’였다. 정부는 신규사업 96개를 추진하는 데 총 84조원의 돈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경비 추산치가 4년간 15조원 안팎이었음을 감안하면, 이와 비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공약의 형태로 지자체에 약속된 셈이다. 그 정치적 결과물은 고스란히 현 정부의 무거운 숙제로 남았다.
정부는 96개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와대, 여야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등 곳곳에 이해 주체가 얽혀 있다 보니 ‘로 키’(낮은 자세) 강박증에 빠져 있다. 이는 서울신문 등 몇몇 언론이 정부가 지역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보도하자 해명 자료를 내며 손사래를 친 데서 잘 드러난다.
SOC의 특성답게 지역 공약 중에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중부권의 한 교통 SOC 사업의 경우 지난 25년간 번번이 추진 단계에서 경제성 등을 이유로 백지화됐지만 막상 추진하려면 3조원 이상의 돈이 든다. 현 정부 임기 중 창업·중소기업 지원에 쓰기로 한 공약 가계부 예산의 3배 수준이다. 수도권의 한 교통 SOC 사업도 11조 8000억원 규모의 무상보육·무상교육 확대 공약 예산을 2조원 가까이 웃돈다. 원점 차원의 사업 재검토는 물론이고 “공약의 타당성이 떨어질 경우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한다”(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입장도 “안 되는 사업은 폐기한다”로 수정이 돼야 하는 이유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지자체 이슈가 많다. 내년 지방선거는 차치하더라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지방소비세·교부세 조정 등 정부와 지자체 간의 뜨거운 현안들이 널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낮은 자세를 강조하는 점이 일면 이해는 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체 나라 경제다. 경제와 민생의 논리로 판단해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맹목적인 ‘공약 가계부’의 이행이 아니라 자신들이 낸 세금을 제대로 활용해 경제를 살리고 고용대란과 가계부채 문제 등 민생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가계 공약부’의 완성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windsea@seoul.co.kr
2013-07-0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